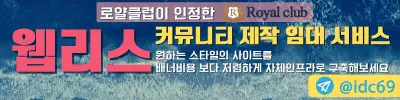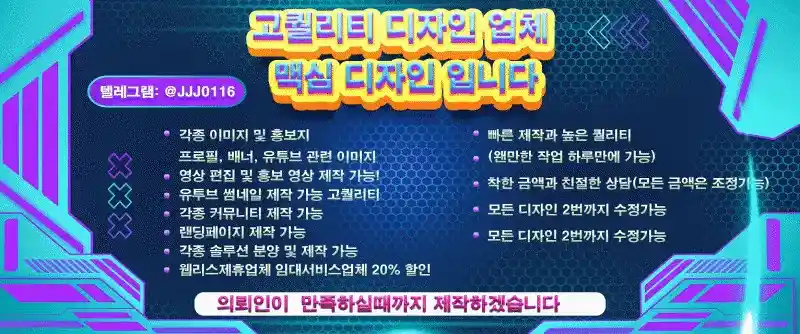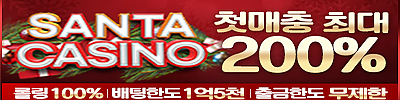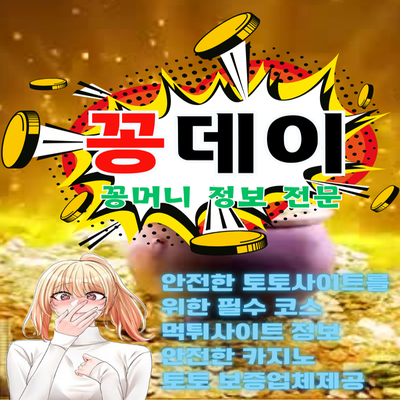서울시 지원 중단, 19년 이어온 사업 종료가 아쉽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8
본문
[김성호 평론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 하는 <붉은 돼지>란 애니메이션이 있다. 20세기 초반 이탈리아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던 마르코가 주인공인 돼지, 한때는 인간이었으나 어쩌다 돼지머리를 하게 된 것인지 모를 이의 이야기다. 이탈리아를 장악한 파시즘의 물결에 회의를 느껴 공군에서 예편한 그다. 전쟁으로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저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파일럿이 바로 그 남자였기에 원망도 회한도 마음처럼 품지 못했으리라. 그리고 전쟁은 그가 옛 애인만큼이나 아꼈던 그 사내의 목숨을 앗아가니 그는 수많은 인간이 전란을 원하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차마 더는 인간으로는 살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영화 가운데 돼지가 옛 여자가 운영하는 바를 찾는 장면이 있다. 바의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젊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들어 있다. 그건 어쩌면 돼지의 사람일 적 모습일까. 아니면 돼지와 친했던 친구일까. 돼지가 사랑했던 여자 지나는 제게 파일럿 남편이 세 명이 있었고 그 모두와 사별했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돼지도 그중 한 명이었을까. 그녀 앞에서 돼지는 담담하게, 그러나 쓸쓸함을 아주 감추지는 못한 채로 말한다.
|
|
| ▲ 독립영화 쇼케이스 현장 사진 |
| ⓒ 김성호 |
그렇다. 좋은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어디 좋은 사람만이겠느냐만, 좋은 이의 죽음이 유독 가슴에 남는 것은 그것이 제게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기 때문이다. 십수 년이 흘러도 일터 벽면에 사진으로라도 붙여놓아야 할 만큼. 바의 벽면이 아니라도 가슴 한편에는 떠나보낸 좋은 이의 존재가 남아 있을 게 분명한 일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좋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가 사는 서울을 더 좋은 곳이라 여기도록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달 개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이 그리 쉽게 생기지 않음을 알기에, 지나가 잃어버린 옛 사람들을 애달파하듯, 돼지 또한 지나와 친구를 그리워하듯이 그를 안타깝게 여긴다.
'독립영화 쇼케이스'라는 행사가 있다. 아니, 이제는 '있었다'고 적어야 할 것이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지난 2007년부터 주관해 온 행사로, 주목할 만한 독립영화를 한국 관객에 무료로 알리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이달 <콘크리트 녹색섬>으로 227회 차를 맞은 행사는 그만큼이나 많은 독립영화 창작자에게 쉬이 마주하기 어려운 관객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다. 극장개봉이 쉽지 않고 개봉한다 해도 상영관 접근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한국 독립영화를 만나볼 유익한 기회였다.
|
|
| ▲ 2024 독립영화 쇼케이스 책 표지 |
| ⓒ 한국독립영화협회 |
18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227회 독립영화 쇼케이스에 앞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 행사가 이날로 마지막이라 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며 사업을 더는 지금과 같이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미 지난해부터 상영회차가 크게 줄어든 행사였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 동안 거의 상영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업이 종료된다는 통보에 이른 것이다. 연간 상영회 기록을 바탕으로 출간되던 책자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멈추게 됐다(관련기사: 어디서도 만나기 어려운 내밀한 독립영화 이야기 https://omn.kr/2f4ym)
이로써 내가 사는 고장을, 도시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또 하나 잃었다. 내가 사는 도시에 의해.
이날 상영된 작품은 이성민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이었다. 지난 씨네만세에서 소개했듯, 작품은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나무들을 지키려는 감독의 노력을 보인다. 재개발이 될 거라며 20여 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단지는 나무에겐 도리어 축복과도 같았다. 서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자연이 사람 사는 터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나무가, 자연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이곳이 확인케 했다. 그 울창함이란 숲이라 불러도 좋을 모양이 아닌가.
|
|
| ▲ 콘크리트 녹색섬 포스터 |
| ⓒ 한국독립영화협회 |
일견 영화는 비극적이다. 수만 그루 나무가 하나하나 베어지고 영화의 중심이 되는 건 그 콘크리트 단지 가운데 단 한 동, 수백 그루의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나무들마저 하나하나 또 다시 베어지는 것이다. 고된 노력 끝에 감독이 얻어낸 답은 재개발에 예정된 공원 부지 안에 들어온 나무만큼은 살려주겠다는 것. 그러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나무 22그루는 고작 1미터 차이를 두고 공원 부지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 1미터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수십 년간 살아온 터에서 하루아침에 잘려 쓰러지는 거목들의 모습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좋을까. 그걸 자르도록 한 이들, 재개발 도면을 맡은 이며 조합 담당자들은 그 나무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 나무들이 살아온 이력과, 이 나무들과 교감해 온 사람들의 사연을 그들은 고려하긴 했을까.
거목이 쓰러진 자리엔 세련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섰다. 단지 안엔 다시 수많은 나무들이 심겼다고 전한다. 이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이성민 감독은 "얼마 전에 개포동에 다시 다녀왔는데, 네 그루를 심으면 세 그루가 죽는 곳도 있더라"며 "전과 다른 인공지반이라 나무가 뿌리를 뻗을 수 없고, 결국 그렇게 죽을 걸 고려해서 더 많이 심는다고 하더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단지에 사는 이들은 제가 나다니는 곳에 조경 목적으로 심긴 나무가 이처럼 죽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심긴 나무들은 생명과 물건 중 어느 것으로 대우받고 있는가.
<콘크리트 녹색섬> 속 쓰려지는 나무들과 중단되는 독립영화 쇼케이스의 현실을 겹쳐 보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수십 년을 지탱한 멋드러진 거목일지라도 무심한 전기톱날 에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 있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또 내가 아끼던 것을 한 가지 잃었다. 그렇다면 나무가 쓰러진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덧붙이는 글 | 김성호 평론가의 브런치(https://brunch.co.kr/@goldstarsky)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씨네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