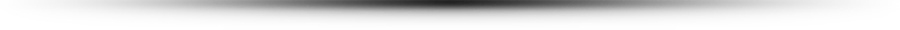*내어머니의 몸값을 국회에 묻는다* (1)

*내어머니의 몸값을 국회에 묻는다* (1)
어디서부터 이 이야길 할 수 있을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나는 이야길 마칠수 있을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길 굳이 모든이들에게 드러내려는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언제나 숨길 원했고 어두움을 좋아했던 내가, 이제 정리된 이야기라고 자위하던 내가... 그런가, 결국 이 이야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1986년 봄, 아버지의 주검을 처음 발견한건 나 자신이였다. 7살의 어린꼬마가 동네 야산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건 경미한 일이 아니였음에도, 꼬마는 무척이나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나 자신도 묻지 않았던 것은 그 담담함에서 연유한 것이리라. 너저분하게 조각난 기억의 파편에서 내가 찾을수 있는건 아버지가 안기부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다. 어린 꼬마는 여물지도 않은 머리를 써 가며 아버지의 죽음과 그것을 용케도 연관지었었다.
내 주위엔 아무런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었다. 어린 나에겐 그들의 얼굴을 익힐 시간마저도 부족할만큼 그들은 자주 얼굴이 바뀌였다. 그들은 날 보살펴 주고, 때론 입학식과 졸업식에 찾아와 주곤 하였다. 정작 나의 어머니라는 분은 보이질 않았지만... 우리집은 돈이 많았었고, 또한 많다. 그땐 그이유를 알려하지 않았었다. 주위에 왕래하는 친척이 있는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일을 하는 가장 또한 없는 집안인데, 돈이 넘쳐난다는 누구든 되물을수 있는 질문을 그땐 던지려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될 운명이였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한초희, 나의 어머니... 그녀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진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확실히 그녀는 여느 가정집에나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구정물에 손을 담궈 접시를 닦는 아낙네에 모습은 아니였다. 서구적인 이목구비에, 일반 성인남자들에게 버금가는 신장과, 기름끼 넘쳐나는 육체의 외곽선까지, 그땐 그녀가 있어 내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땐 왜 몰랐을까? 모든 남성의 뿌리까지 집어삼킬 매혹적인 입술과 짐짓 정숙해 보일 커다란 눈가에 흐르는 그녀의 색기를...
1994년 겨울, 그해 겨울은 그녀와 나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렇게도 추웠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식을 마치고, 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다다라서야 등교 할때 챙기지 못한 열쇠꾸러미와 아버지 장례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간 아줌마가 떠올랐다. 그러나 나에겐 새벽시간에 외출을 자유롭게 만드는 목낮은 뒷뜰담장이 있었기에 별걱정이 되지 않았다. 방학을 맞이한 한량한 마음으로 난 기꺼이 담장을 넘고 있었다. 어떻게든 운명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그 담장을 넘지 않았어야 했다. 그때 그 담장을 넘지 않았어야 했다. 집안에 있는게 나만이 아니란걸 알게된건 담장을 넘은 후 오래지않아서였다. 그것은 뒷담장과 맞닿아 있는 안방에서 나오는 사람의 소리때문이였다. 소리, 후후..., 정확히 말해 신음소리, 그때 그것으로 인해 유추할게 전혀없는, 아니 어머니와 그 소리를 연계할수 없는 소년은 그것을 알아야했기에 안방 뒷창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평상시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연인 어머니의 방인데도 불구하고 맘대로 출입할 수 없는 그 방의 호화스런 침대엔 세남녀의 형상이 있었다. 20대초반에 잘생긴 남자와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한초희, 나의 어머니,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 있었다. 꿈처럼 여우처럼 그렇게 그곳에 있었다. 날 몽한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서 내 기억에 들어 박혀버린것은, 뉴스프로그램을 자주 봤다면 알수 있을 중후한 남자에 안면이나 젊은 남자의 불긋하고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한초희의 입술에 쳐박혀있는 성기도 아니였다. 그것은 50대 남자의 입출입을 허락한채 한없이 벌어져있는 어머니의 성기였다. 깨끗한 조개를 닮은 그것은 그때의 상황이나 애액으로 번들거리는 그것의 처지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신성해보였다.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고귀하여 더럽히고 정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 같았다. 어느것이 현실인지 어느것이 꿈인지... 그런 상태로 소년은 뒷담장에 웅크린채 저녁을 맞이하였다.
소년을 깨운건 한겨울 저녁에 부는 매서운 바람이였다. 어쩔수 없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감당할수 없는 충격을 겪어도 인간은 어차피 자기합리화로 살아가는 약한 동물인 것을. 현관을 들어서자 마자 궁금한 사람을 쉽게 만날수 있었다. 한초희, 그녀가 카펫트 위에 쓰러져 있었다. 속이 비치는 슬립만을 걸친채, 바닥엔 주사바늘이 널부러진채 그녀는 쓰러져있었다. 난 그녀를 옮겨야 했다. 한참전에 벌어진 일일진데 안방은 퀘퀘한 담배냄새와 비위를 거슬리는 끈적거리는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지할만한 정신이 내겐 없었다. 내 가슴팍에서 꿈틀거리는 한초희의 가슴때문에, 내 왼손께에 닿아있는 기름기 오른 그녀의 허벅지살 때문에... 그녀를 침대에 내려놓았을때 처음으로 그녀의 나신 정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부 볼 순 없었다. 내눈은 그녀의 사타구니에 초점이 박혀버렸으니... 그녀의 가슴은 누가 봐도 매혹적인 가슴일진데, 기름기 오른 허벅지가 있는 매끈한 다리도 누구나 탐할 그것일진데... 소년은 한참이나 밑에 깔려있는 친모의 사타구니를 보고 있었다. 보는 것이 소년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소년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또 보았다.
소년을 현실로 돌아오게 만든건 한초희였다. 그녀가 눈을 떳기 때문이다. 몽한적인 눈빛을 하고선 그녀는 날 쳐다보고 있었다. 이곳이 어딘지 모를듯한 눈빛을 하고선, 이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도 좋을듯한 눈빛을 하고선, 그리고는 날 보고서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색기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다. 어린 아들놈의 뿌리라도 집어삼킬듯한 색기 어린 웃음을 입술에 담고 있었다. 그때 난 그것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난 그곳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난 이곳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