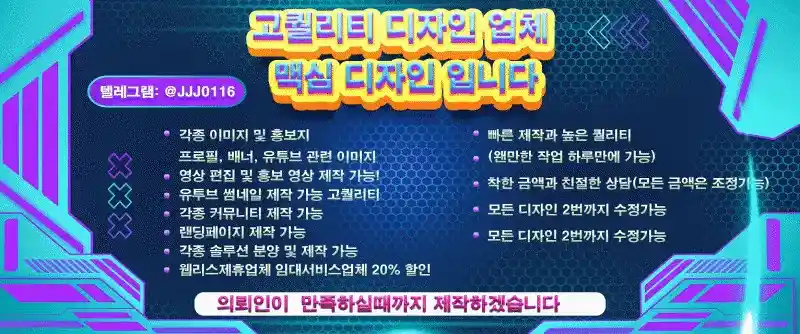시작부터 논란된 KIA 이 선수… ‘호주 폭격’했는데 억울? KIA는 정면돌파 증명할 수 있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
본문

[스포티비뉴스=김태우 기자] KIA는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결정이 가장 늦은 팀이었다. 그렇다고 레이더를 게을리 돌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팀 사정과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KIA는 당초 지난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불펜 보강을 염두에 뒀다. 여기까지는 타 구단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 KIA는 가장 먼저 두 명의 투수를 테스트했다. 2025년 시즌 뒤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이마무라 노부타카를 오키나와 마무리캠프로 불러 직접 테스트했고, 독립리그에서 성적이 좋았던 한 투수 또한 후보군 중 하나로 올려놓고 관찰을 이어 갔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두산과 4년 80억 원(보장 78억 원·인센티브 2억 원)에 계약한 것이다. KIA는 박찬호 잔류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두산의 제안은 KIA의 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되자 프런트와 현장 모두 고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박찬호는 지난 몇 년간 팀의 주전 유격수로 공·수·주 모두에서 맹활약했다. 여기에 부상이 많은 선수도 아니었다. 건강하게 뛰었다. 이는 팀의 유격수 포지션 안정에 큰 공헌을 하기는 했으나, 역설적으로 다른 선수들을 유격수 자리에서 테스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졌다. 그렇다고 리빌딩 팀이 아닌 만큼 멀쩡한 선수를 빼고 어린 선수들만 테스트할 수는 없었다.
김규성 박민 정현창 등 백업 유격수 자원들이 있었으나 한 시즌을 주전으로 뛴 풀타임 경력이 없었다. 결국 KIA는 호주 출신의 유격수인 제러드 데일(26)을 오키나와로 불러 테스트를 거쳤다. 꽤 만족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결국 계속해서 고민한 끝에 데일로 낙점했고,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야수로 아시아쿼터를 채우는 팀이 됐다. 팀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총액 15만 달러(계약금 4만 달러·연봉 7만 달러·인센티브 4만 달러)에 계약을 마쳤다.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박찬호를 놓쳤고, 박찬호의 뒤를 이을 선수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임시 방편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쿼터를 언제까지 외국인 선수로 쓸 수 없다는 점은 구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 양상이다. 다만 KIA는 리빌딩 팀이 아니다. 올해도 목표는 포스트시즌 진출 그 이상이다. 부상 악몽만 안정된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풀타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을 유격수로 쓰기는 쉽지 않았고, 일단 데일이라는 징검다리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데일도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지만 호주 리그와 일본프로야구 2군에서는 괜찮은 공격 성적을 거둔 선수다. 2023-2024 호주리그에서는 타율 0.327, OPS(출루율+장타율) 0.777을 기록했고, 2024-2025 호주리그에서는 34경기에서 타율 0.381, 3홈런, 19타점, OPS 0.935라는 대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일본 2군에서도 41경기에서 타율 0.297, OPS 0.755를 기록했다. 홈런 파워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유격수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수비력과 콘택트 능력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꼭 유격수가 아니더라도 2루나 3루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 포지션 소화 능력도 있다. 시작부터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결국 이를 풀어나가는 것은 선수 자신의 몫이다.
다만 데일 또한 144경기씩 이어지는 장기 리그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아무리 유격수라고 해도 공격에서 고전한다면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즉, KIA는 데일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고, 그 사이 차세대 주전 유격수를 찾고, 여기에 우려를 모으는 불펜도 안정감까지 찾아야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꽤 고난이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