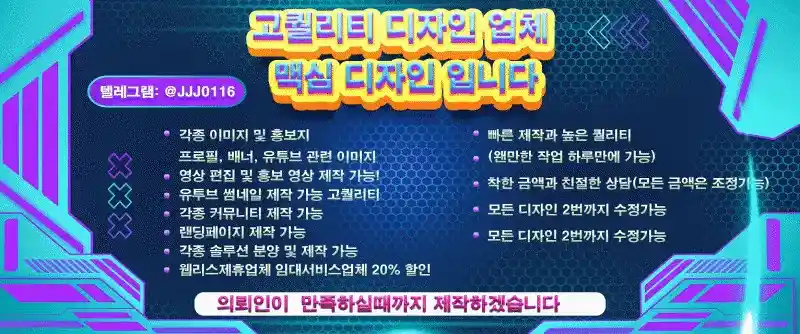심판을 향한 극단적 비난…모두 책임자인 동시에 피해자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5
본문

2025년 한국 프로축구는 흥행 면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K리그는 3년 연속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했고, 1·2부 리그 합산 관중은 348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라운드 밖 풍경은 그리 건강하지 않았다. 경기 내용보다 논란이 앞섰고, 승패보다 말과 행동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중심에는 심판을 향한 과도하고 극단적인 비난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프로축구에서는 VAR이 도입됐음에도 오심은 반복됐고, 일부 판정은 경기 결과를 직접적으로 바꿨다. 제주 SK와 전북 현대전전에서는 페널티킥 선언 여부, 안양과 포항전에서는 팔꿈치 파울 판정에 대한 논란, K리그2에서조차 육안으로 명백한 온사이드가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는 장면까지 나왔다.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K리그 오심이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늘었으며, K리그1의 경우엔 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판정 불신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심판 개인의 역량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 판정 능력 향상, 일관성 회복, 파벌 문화와 잘못된 권위주의 극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 프로축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자, 선수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카드를 꺼내려는 경향이 짙어졌다”며 “심판이 궁지에 몰리면서 오기만 남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심판들은 자신의 재계약 여부, 1부리그 잔류 여부 등을 위해 자신들의 배정권 등을 가진 심판위원회가 원하는 식으로 휘슬을 불었다. 한 심판은 “심판 본인은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휘슬을 불 수밖에 없었다”며 “심판 개인 판단과 심판위원회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게 반복되면서 심판의 일관성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판정은 수학 문제가 아니다. 같은 장면도 경기 흐름, 위치, 속도, 접촉 강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애매한 상황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에 가깝다. 심판을 외면하는 구조적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현장 심판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 심판들이 설 자리는 없다. 한국은 4개 월드컵 연속으로 월드컵 심판을 배출하지 못했다. U-20 월드컵, 클럽 월드컵에서도 한국 심판은 없었다.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예산은 감소했다. 프로축구연맹도 수당 지급 외에 육성과 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한국축구 규정과 문화를 책임져야하는 두 곳이 심판을 키우지도, 보호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선수와 감독이 심판을 돕기보다 속이려 한다. 감독은 정확하게 보지도 못해놓고 무턱대고 자기팀이 파울을 당했다고, 볼은 우리 것이라고 몸부림을 친다. 선수들은 볼이 누구 것인지, 누가 파울을 저질렀는지 거의 대부분 안다. 그런데 모두 자기 볼, 남의 파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선수는 자기가 파울을 해놓고 파울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모두 피해자인 척할 뿐 누구도 심판이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판정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판정이 틀렸더라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심판 문제를 심판 개인의 자질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협회·연맹·구단·지도자·선수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 프로축구 종사자는 “심판을 공격의 대상이 아닌 축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판정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심판이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는 순간, 축구 역시 멈춘다. 심판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한국 축구 산업을 떠받치는 필수적인 동반자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