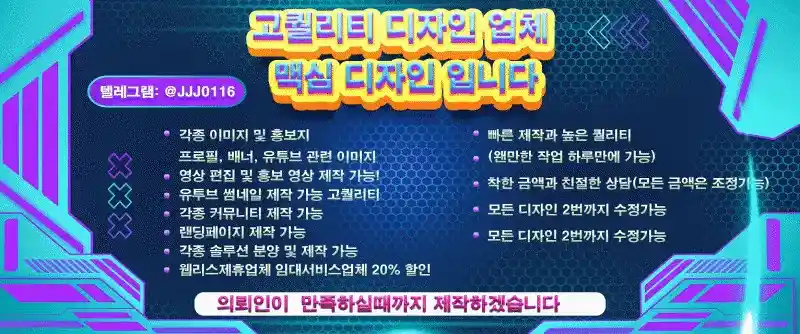한일합섬 여공, 영화로 소환해 당당히 세우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
본문
창원에서 영화를 만드는 동호회 '빛공방'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왔다. '빛공방'은 2021년 경남영화아카데미를 함께 수료한 김진(43)·이기혜(46)·장가영(37) 감독이 뭉쳐 만들었다. 2022년 <어느 다행인 죽음>(감독 장가영), <작은 하루>(감독 김진)를 제작한 이들은 2023년 여성이자 감독으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찍는 마음>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기록이 없어, 기록에 나서다
장가영 감독은 2022년부터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경남여성생애구술사'에 작가로 참여했다. 이때 한일합섬에 일했던 여성 노동자를 만나게 됐다. 한일합섬은 마산이란 도시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섬유제조기업이었다. 2006년 옛 마산시 양덕동에 있던 공장이 완전히 철거되고, '한일합섬 옛터'라고 적힌 비석 하나만 남긴 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장 감독은 이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참 값지다고 느꼈고, 더 풀어가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감독이 다시 뭉쳐 옛 여성 노동자들의 기억과 이름을 소환했다. 빛공방은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다큐 영상콘텐츠지원사업에 지원해 선정됐고, 3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완성했다.
기억을 되살리려면 한일합섬에서 일하면서,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현 한일여자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다. 한일합섬 부설 한일여실고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한일합섬에 다니던 '여공'들이 일을 마치고 공부하던 곳이었다. 많은 이가 한일여실고를 다녔다는 사실을 잘 말하려 하지 않거나, 기억하려 하지 않아 섭외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한일여실고 졸업생 천은미·박경란·이필선·정선아·하명숙·김민정 씨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
"박경란·이필선 씨는 양덕동에서 야외 촬영할 때 협조를 구하려고 들어간 식당에서 만난 분들이다. 이들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인터뷰하고 촬영했다. 이들을 보면서 한일합섬에서 일하고, 한일여실고에 다녔던 이들이 마산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영화의 첫 장면은 공장이 완전히 철거되는 모습이다.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깊숙하게 스며있다. 이윤기 마산 YMCA 총장이 당시 찍은 영상이다. 한일합섬 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굴뚝이 천천히 기울면서 부서진다. 영상은 흔들리기도 하고 초점이 가끔 오락가락한다. 화질도 깨끗하지 않다. 영화 속에선 등장인물들의 소회를 담은 말들이 낮게 깔린다.
어린 여성 노동자로 한일합섬을 일궈왔으나 부도 후 공장을 없애면서 당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모습이 영상 한 장면에 나타난다. 장 감독은 굴뚝이 쓰러지는 영상이 사람, 노동 이야기는 쓰러져 없어지고, 돈의 가치로만 기억되고 환산하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고 봤다.
김 감독은 이 총장이 찍은 영상은 연출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기록과 자료들로 영화가 만들어졌으니, 기록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한일여실고 4회 졸업생인 천은미 씨는 상영회 후 간담회에서 "출연 제안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천 씨는 한일합섬이 지역이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월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했다. 장 감독이 출연을 제안했을 때도 "나이 들어서 뭐 하러 영화를 찍나"하며 거절했지만, 그 시절 이야기를 누군가는 말하고 기록해야 함을 깨달았다.
천 씨는 마산여자중학교를 다녔고, 마산여자고등학교나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렇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모의 말에 한일여실고에 입학했다. 열일 곱살에 현실과 꿈 사이에서 괴리감을 겪었다는 말을 담담하게 이어갔다.
하명숙 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친구를 찾고자 영화 출연을 결심했다. 영화 속에서 하 씨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냐는 물음에 잠시 고민하더니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았다. 하 씨는 친구들이 잘 지냈는지, 결혼도 잘하고 자녀는 많이 컸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하 씨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촬영하는 순간 긴장했던지 그는 친구의 이름을 혼동해서 불렀다고 한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들의 이름이라 혼동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장 감독은 굳이 영상을 다시 찍거나 자막을 고치지 않았다. 하 씨가 친구를 다시 만나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볼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
영화는 천은미·정선아·하명숙·김민정 씨가 한자리에서 모여 모교인 한일여고 교정을 다시 찾아가며 마무리한다.


연출과 편집을 주로 맡았던 장 감독은 촬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는 인터뷰 대상자가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다가, 한일합섬과 한일여실고가 자신에게 구세주였다고 말하는 등 양가감정을 품고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그래서 빛공방 3인방은 구성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했다. 마산이란 도시를 탐구하는 허정도 건축사의 소개로 올해 논문 <공동체 아카이브 관점에서 본 여성 노동-교육 기록화 전략 -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사례 중심으로>을 쓴 신주현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세 감독은 그에게서 답을 찾았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일여실고에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영화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 일의 고됨을 이야기했다. 일하다가 바로 주저앉아 자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일을 마치고 나오면 눈과 코에 실 보푸라기가 하얗게 앉아 있었다. 동료의 손가락이 기계에 찧어 다쳤어도, 너무나 흔한 일이라 놀라지 않았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옆에 앉은 친구에게 웃으면서 "저 때만큼 힘든 일이 있더나? 난 그 이후로 없었던 것 같다"라며 웃었다.
상영회에 아들과 함께 온 정 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 같이 운 아들에게는 "엄마는 괜찮아,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잖아"라고 말해주었지만 정 씨 또한 마음이 울컥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도 몇 번이나 출연을 고사했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치유됐다"고 말했다.
"한일합섬에서 일했고, 한일여실고에서 공부했던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서자."
천 씨가 영화 속에서, 상영회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한 말이다. 그는 지금도 마산에 살고 있을 많은 동문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지역 경제와 가정을 책임졌다'는 걸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빛공방이 만든 다큐멘터리 <다시 부르는 소녀들의 이름: 양덕동 한일의 기억>은 1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플랫폼 '인문360'(inmun360.culture.go.kr)과 인문360 유튜브 채널(@inmun360)에 게시돼 5년간 볼 수 있다.
/주성희 기자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