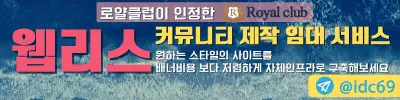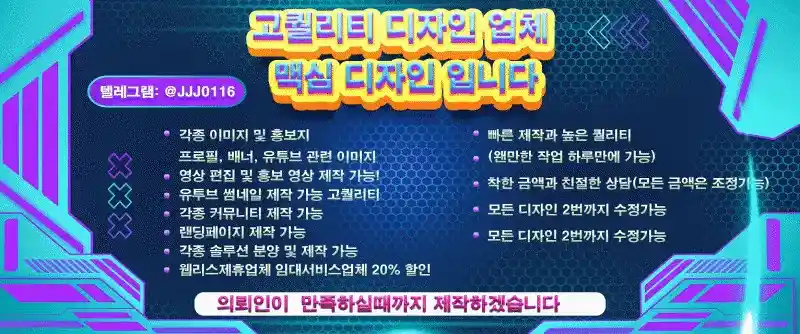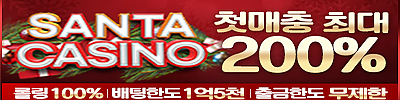대구는 어떻게 ‘야구의 메카’가 됐을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
본문
(시사저널=김양희 한겨레신문 기자)
한국의 야구장 응원 문화는 독특하다. 팀 응원가가 있고, 선수별 응원가가 있다. 삼진송, 아웃송, 볼넷송까지 있다. 응원에는 율동도 포함된다. 수천 명이 같은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응원 수건을 흔든다. 이는 경기 내내 이어진다.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3시간 동안 멈춤이 없다. 여기에 같은 옷까지 입고 있다면? 단결력은 배가 된다. 여러 팀 응원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게 삼성 라이온즈의 《엘도라도》다. 8회 울려 퍼지는 《엘도라도》는 저작인격권 탓에 한동안 야구장에서 사라졌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불리고 있다. 《엘도라도》의 귀환과 함께 대구에는 '야구의 봄'이 왔다.

비수도권에서 야구장은 일종의 '가족 놀이터'
프로야구는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총 관중은 지난해보다 16% 늘어나 정규시즌 동안 1231만2519명(평균 1만7101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10개 구단 관중 수입은 올해 처음 2000억원을 넘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곳은 바로 비수도권 구단인 삼성이다. 삼성은 홈 71경기에 164만174명(매진 53차례)을 불러모았다. KBO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홈 관중 150만 명을 돌파했다. 수도권 구단도 아닌, 인구 237만 명의 도시를 연고로 둔 구단이 이뤄낸 성과다.
삼성의 경기당 평균 관중은 2만3101명으로 역시 1위다. 삼성 말고 평균 관중 2만 명을 넘긴 팀은 정규시즌 1위 LG 트윈스(2만1725명)와 중반까지 돌풍을 일으킨 롯데 자이언츠(2만653명)다. 두산 베어스(1만9595명)는 평균 관중 2만 명에 조금 모자랐다. 서울 연고의 LG와 두산 관중 수를 고려하면, 삼성의 관중 동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새 구장(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화 이글스의 경우 좌석 수가 1만7000석밖에 되지 않아 평균 관중은 1만6875명이다.
사실 삼성은 작년에도 LG(139만7499명·평균 1만9144명)에 이어 홈 관중 2위 구단이었다. 차이는 크지 않았다. 73경기에 134만7022명(평균 1만8452명)을 불러모았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삼성이 시즌 내내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관중 동원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정규리그 7위에 그쳤던 2022년에도 홈 관중 수 3위, 8위까지 떨어진 2023년에도 홈 관중 수는 5위였다. 성적과는 무관하게 관중은 들어차고 있었다는 뜻이다. 9개 구장 중 수용 인원(2만4000명)이 제일 많기 때문인 점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의 정규리그 홈 관중 수는 125만 명(평균 관중 1만6581명·구장 수용 규모는 2만500명)이었다.
올해도 삼성은 전반기까지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순위도 8위에 불과했다. 그래도 대구 야구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습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 5월 이후 티켓 구하기 전쟁이 펼쳐졌고, 번번이 티켓 예매에 실패한 이들에게 "일단 야구장 표는 끊고 보자"는 심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올해 8월 이후 삼성은 본격적으로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을 펼쳤고, 이후 티켓은 더 구하기 힘들어졌다.
함께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했던 코로나19 시절에 대한 보복 심리로 엔데믹 이후 야구장에 사람들이 몰린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왜 유독 삼성 관중이 더 늘어났을까. 대구 출신의 한 관계자는 "대구가 지역주의가 좀 강하다. '삼성은 대구다'라는 인식이 세다"면서 "프로 원년(1982년) 팀이라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딸로 대를 잇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 같은 프로 원년 팀인 부산 연고의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 홈 관중 수 4위를 기록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라이온즈파크나 사직야구장, 그리고 한화생명 볼파크에 가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관중이 꽤 많이 보인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야구장이 일종의 '가족 놀이터'가 된 셈이다.
대구에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프로 구단이 삼성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프로축구는 대구FC가 있으나 역사가 그리 깊지 않다.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인기에 힘입어 2003년 창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FC는 한때 K리그2로 강등되기도 했었고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이 리그 3위(2021년)에 불과하다. 통산 8차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삼성 라이온즈와는 차이가 있다. 남자 프로농구는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있으나 그 뿌리가 대구에 있지는 않다. 원래는 인천에 연고를 뒀다가 모기업 전자랜드가 2020~21 시즌 뒤 농구단 운영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인수한 뒤 2021년 대구로 연고를 옮겼다. 프로배구 구단은 아예 없다. 삼성 야구단의 경우, IMF 때조차 단 한 번도 해체 논의가 없었고, 연고지 이전 등의 말 또한 나오지 않는 팀이다. 44년 가까이 이어져온 안정감이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됐다고 할 만하다.
대구 홈경기에서 유독 강한 삼성, 승률 0.573
삼성은 올해 대구 홈경기(68경기·포항에서 3경기)에서 유독 강했다. 승률이 0.573(39승29패)에 이르렀다. 원정 승률(0.465·33승38패2무)보다 1푼 이상 높았다. 더불어 라이온즈파크는 '야구의 꽃' 홈런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올해 삼성 타자들이 대구에서 때려낸 홈런 수만 96개(총 161개). 경기당 평균 1.41개로, 지고 있더라도 경기 흐름을 바꿀 '홈런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다.
2030 여성팬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세대교체에 성공해 젊은 선수들이 팀 주축을 이룬 점도 주효했다. 2000년대생인 김지찬·이재현·김영웅·김현준(현재 상무 입대) 등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빠르게 프로에 적응하면서 팀 주전 자리를 꿰찼고, 잘생기고 귀여운 외모로 여성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경복중-경북고)과 '라이온즈의 심장'인 구자욱(경복중-대구고)은 대구에서 나고 자란 '로컬 보이'이기도 하다. 어릴 때 삼성을 응원하며 자랐고, 삼성 선수가 롤모델이었던 이들이 삼성의 기둥이 되는 서사가 완성됐으니 '우리 선수'에 대한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다.
삼성의 홈 관중 증가는 단순한 흥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팬층의 세대교체, 지역 정체성과의 결합, 준비된 인프라, 그리고 안정적인 구단 운영이 만들어낸 복합적 현상이다. 대구의 야구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그 중심에는 '우리 팀'과 '우리 선수'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다.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워어어어어어~"(응원가 《엘도라도》 중)의 외침 안에는 "우리(대구)는 승리한다"라는 강한 열망이 담겨있다.
관련자료
-
링크